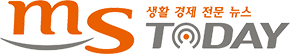참외가 나는 철에 제사가 있으면 어김없이 참외를 제수로 올린다. 제수 물품 중에 참외가 들어가는 것은 이미 조선 시대 기록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최근 만들어진 관행은 아니다. 조선 후기 문인인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의 글에 보면 추석이 초가을에 들면 제사상에 벼, 감, 대추, 밤을 올리되 시속(時俗)을 따라서 조기, 웅어, 은어, 수박과 함께 참외를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일반 대중들에게는 참외가 이미 제수로 널리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삼국시대부터 참외가 한반도 지역에서 재배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참외 모양의 도자기도 많이 남아있고, 고려 시대 기록에서는 참외와 관련된 단편적인 기록이 여기저기 나오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참외는 친숙한 과일이다. 참외를 과일이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식품 분류상으로 보면 채소 혹은 과채류에 해당한다. 고려 후기 문인인 이암(李嵒, 1297~1364)이 원나라에서 들여온 농서로 우리나라 농업사에 큰 영향을 끼친 ‘농상집요(農桑輯要)’에는 황과(黃瓜)라는 것이 등장한다. 이것을 참외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는 고려 숙종 2년(1104) 기록에 등장한다고 한다. (물론 맥락에 따라 참외가 아니라 다른 오이 품종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렇게 보면 참외의 재배 역시 오랜 유래를 가지고 있다.

시대가 흐르면서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기도 하고 자연환경의 변화와 함께 기존의 품종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으며, 나아가 분류 기준에 대한 인식이 점점 세분되고 강화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이런 탓에 과거의 기록에 등장하는 과일이나 채소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품종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하나의 단어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맥락뿐 아니라 그 글을 기록한 사람이 살았던 농업 환경 등 다양한 조건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품종의 이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적을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 옛 기록을 확인할 때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瓜)’ 역시 마찬가지다. 이 글자는 일반적으로 오이를 지칭하지만, 오이라고 해서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탓에 한문 사용자들은 정확한 이름을 붙이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참외만을 명확하게 지칭하는 한자어는 ‘첨과(甛瓜)’다. 단맛이 나는 오이라는 뜻의 첨과는 참외를 지칭한다. 이 단어는 고려 말 이색(李穡, 1328~1396), 원천석(元天錫, 1330~?) 등의 문집에서 발견되는데, 이로 미루어 보건대 참외를 지칭하는 ‘첨과’는 고려 말에 정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전기가 되면 앞서 언급한 서거정이라든지 신숙주(申叔舟, 1417~1475), 김시습(金時習, 1435~1493) 등 모모한 문인들의 시문에 다수 등장한다. 이러한 사정은 참외가 민간에 비교적 널리 알려진 것과 궤를 함께하는 것이다.
허균의 ‘도문대작’에 등장하는 참외 역시 이러한 문화적 맥락에 이어진 것이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참외[甛瓜] : 의주(義州)에서 나는 것이 좋다. 작으면서도 씨가 작은데 매우 달고 부드럽다.”

품종으로는 금싸라기, 오복꿀 등 널리 알려진 것이 있지만, 지역 이름을 붙여서 성환 참외라든지 성주 참외 등으로 부르면서 판매되는 것들도 많다. 백여 년 전만 해도 한반도는 동네마다 내세우는 참외의 명산지가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 재배되고 있었다. 강원도만 하더라도 횡성과 양양의 참외가 명물이었으며, 춘천 전평(前坪) 너른 들에는 수많은 원두막이 있을 정도로 맛있는 참외를 엄청나게 재배하고 있었다. 당시 문인이자 언론인이었던 차상찬(車相瓚, 1887~1946)의 글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니와, 그는 자신의 고향 춘천의 참외밭 풍경을 ‘큰 시장에 노점이 들어선 것 같다’고 표현한 바 있다. 그만큼 재배도 많이 되었지만, 참외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풍경을 그린 것이다.
차상찬이 의주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평안도에서 참외를 많이 재배했었다고 한 것을 보면, 허균이 의주 참외를 언급한 것이 과히 어색하지는 않다. 허균이 ‘도문대작’에서 언급한 것은 전적으로 그의 음식 경험을 바탕에 깔고 있은 것이므로 당시 조선의 재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지는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가 의주 지역을 오가면서 맛보았던 참외가 아주 달고 부드러워서 맛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아쉽지만 허균의 글에서 참외에 대한 기록은 ‘도문대작’의 것이 유일하다. 심지어 중국 문인들의 글을 모아 편집한 ‘한정록’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란색의 달콤한 참외는 외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참외를 ‘korean melon’이라고 지칭한다는 말을 들었다. 한반도의 풍토에 맞는 참외가 오랫동안 재배되었기 때문에 한자로 정확하게 표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때문에 ‘첨과’라는 한자어 표기가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한다.
‘참외’라는 말에서도 그 열매에 대한 사람들의 애정을 느낄 수 있다. 한자로 번역해서 ‘진과(眞瓜)’로 표기하는 참외는 오이 중에서도 진짜 오이라는 의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이라든지 호박, 수박 등이 대체로 오이의 넓은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진짜 오이는 참외라는 것이다. 강원도 영동지역만 하더라도 참외와 구별하기 위해 푸르고 길쭉한 오이를 물 외라고 불렀다. 물이 많아서 물 외라는 이름이 붙은 것인데, 이 품종이 오이 중에서는 가장 널리 재배되고 식자재로 사용된다. 그렇지만 역시 참외야말로 여러 오이 품종 중에 진짜라는 인식이 그 이름에 온전히 들어있다.
흥미롭게도 참외는 의술에서도 요긴한 재료로 여겨진다. 조선의 명의 양예수(楊禮壽, ?~1597) 등이 편찬한 ‘의림촬요(醫林撮要)’(권6)에 보면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을 치료하는 약으로 첨과엽(甛瓜葉) 즉 참외 잎을 찧어서 즙을 내어 머리에 바르면 효과가 있다고 기록했다.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머리카락이 빠져서 고민인 상황을 많이 겪는다. 이 처방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심풀이 삼아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