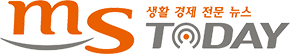‘만두(饅頭)’라는 한자어 때문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의사소통이 어긋나기도 한다. 재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두라고 하면 가루를 반죽해서 만든 얇은 피에 속 재료를 넣고 그것을 오므려서 찌거나 탕을 끓일 수 있는 것을 통칭한다. 흔히 ‘만두소’라고 하는 속 재료가 들어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만두(만터우)는 소가 없이 발효된 밀가루를 그냥 쪄내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빵과 같은 모양새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만두처럼 소가 들어가는 것을 중국 사람들은 ‘교자(餃子, 자오쯔)’라고 부른다. 얇은 피로 소를 감싸는 교자와는 달리, 그보다 조금 두꺼운 피에 소를 넣어서 쪄내면 그것을 포자(包子, 파오쯔)라고 한다. 우리는 교자와 포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단 피에 소를 넣어서 쪄내면 만두라고 통칭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차이를 보인다.
별식으로 취급되는 것이라 그런지 전승되는 만두의 종류 역시 많다. 만두라는 이름이 널리 통용되기는 했지만,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것들도 다수 전승된다. 개성이나 해방 이전 서울 지역에서 만들어 먹었던 편수(片水)라든지, 수라상에까지 올랐다고 하는 규아상, 유두 무렵이면 먹었다고 하는 상화병(霜花餠), 석류탕(石榴湯), 숭채만두(菘菜饅頭, 배추만두), 어만두(魚饅頭), 동아만두 등도 요리 재료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면 만두를 만드는 방식과 같기 때문에 만두의 변형으로 본다. 거기에 메밀만두, 진만두(進饅頭), 보만두(洑饅頭) 등이 전승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 개성만두, 평양만두, 진주만두처럼 지명을 붙여서 그 특징을 드러내는 예도 있다.
허균의 시대에도 만두는 널리 즐기는 음식이었다. ‘도문대작’에서는 만두를 세 군데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문맥의 이면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모두 흥미로운 기록이다. 우선 한양 지역의 절기 음식 즉 절식(節食)으로 만두를 들고 있다. 봄에는 쑥떡이나 송편, 두견화전, 이화전 같은 음식을 들었고, 여름 음식으로 장미전, 수단(水團), 쌍화(雙花)와 함께 만두를 들었다. 이렇게 보면 허균이 한양에서 경험했던 계절 음식 만두는 여름에 먹는 것이었다. 쌍화는 앞서 언급한 상화병을 지칭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만두 조리 방법과는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크게 보면 만두에 속하는 음식이니, 조선 중기 한양 사람들은 여름철에 만두 종류의 음식을 매우 즐겼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서술이 워낙 단편적이다 보니 허균이 말하는 만두는 어떻게 먹었는지 알 길은 없다. 그러나 여름에 먹었다면 아무래도 만두 종류 중에서 여름철에 자주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 조리 방식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상화병과 함께 유두절 무렵에 먹었다고 하는 규아상과 같은 만두를 먹지 않았을까 추정해본다.
두 번째 기록으로는 꽃전복을 의미하는 화복(花鰒)을 소개하면서 스치듯 언급한 서술이다. 허균은 화복을 기록하면서, “경상북도 바닷가 사람들은 전복을 따서 꽃모양으로 썰어서 상을 장식하는데 이것을 화복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 서술에 이어서 “전복 중에서 큰 것은 얇게 썰어 만두를 만드는데 이 또한 맛있다”고 하였다. 요즘은 전복만두를 파는 곳이 더러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 진귀한 음식이었을 것이다.

세 번째 기록은 대만두(大饅頭)를 소개한 글이다. 그는 ‘도문대작’에 대만두를 하나의 항목으로 제시하고 이렇게 설명하였다. “대만두(大饅頭). 의주(義州) 사람들은 중국 사람처럼 잘 만든다. 그 밖에는 모두 좋지 않다.” 큰만두라는 뜻의 대만두는 근대 이전 기록에서는 오직 허균의 ‘도문대작’에서만 보인다. 그렇다면 이 명칭은 허균이 임의로 붙인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가 말하는 대만두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중국 사람처럼 잘 만든다고 한 것을 보면 의주 사람들이 만드는 만두는 중국의 파오쯔처럼 큼지막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워낙 짧은 기록이라서 더 이상의 추적은 어렵지만, 동아시아 문화에서 만두는 보편적으로 널리 즐겼던 음식이었음은 분명하다.
연구자들이 가장 근사하게 추정하는 것은 대만두가 보만두였으리라는 것이다. 보만두는 일제강점기에 출판된 요리책에 소개가 된 것이다. 이용기(李用基, 1870~1933)이 지은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보만두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말한다. 수십 개의 만두를 작게 빚은 후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큰 만두피로 감싼 뒤 찌거나 삶아낸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만두라고 하는데, 워낙 크기 때문에 큰만두 혹은 대만두라고 부른다고 했다. 허균이 말하는 대만두가 이것을 지칭한다는 증거는 없으니, 여전히 오리무중일 수밖에는 없다.

만두는 언제부터 만들어진 것일까? 어떤 사물이든 그것의 기원을 찾는 일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때로는 허망하기도 하고 의미 없는 작업일 때도 있다. 만두의 기원을 찾는 일도 마찬가지다. 흥미롭기는 하지만 그것이 시작된 지역이나 의미 등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결국, 호기심 가득 어린 전설 차원에서 한담(閑談) 수준에서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만두의 기원에 관한 전설은 제갈량(諸葛亮)과 관련시키는 이야기다. 고대에 중국 남쪽 지역, 중원 지역 사람들이 흔히 남만(南蠻, 남쪽 오랑캐)이라고 지칭하는 지역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의 머리를 올리는 풍속이 있었다. 제갈량이 맹획을 완전히 복종시킨 뒤 사람의 머리처럼 음식을 만들어서 제사상에 올렸다. 그것이 바로 만두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 설화는 1839년 청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던 한필교(韓弼敎, 1807~1878)의 ‘수사록(隨槎錄)’(권6)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명칭도 모양도 달랐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중국에게 만두는 일용식이었지만, 조선에게 만두는 별식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만두 역시 지역에 따라 혹은 재료에 따라 명칭도 다르고 먹는 시기도 다르고 드물지만 먹는 방법도 달랐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설날에 떡국이나 만둣국을 먹으면서 새해를 맞이한다. 오랜 식생활의 전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풍속 중의 하나일 것이다. 흥미롭게도 허균이 기록한 만두는 여름에 즐기는 음식이었고, 예전 기록을 보아도 겨울 뿐만 아니라 여름에 즐기던 절식이었다. 늘 겨울에 만두를 즐기던 나에게는 만두의 재발견이나 다름없었다. 올여름에는 전국의 만두를 맛보는 만두 순례를 해볼 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