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순간 인간의 중요한 욕망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맛이라고 극찬했다는 소동파(蘇東坡)의 말이 아니더라도 ‘복요리’가 주는 즐거움은 상당하다. 지리나 얼큰한 탕으로 먹어도 좋고 회로 먹어도 좋으며 무침이나 불고기 형태로 먹어도 좋다. 조금은 밋밋한 맛 때문에 미나리를 넣어서 함께 먹기도 한다. 뼈부터 껍질까지 부위마다 그 나름의 풍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어를 좋아하는 미식가들도 자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부위와 조리 방식이 있을 정도다.
심지어 복어의 독까지도 치사량 직전까지 넣어서 먹는다고 하니, 그야말로 복어가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맛을 지닌 생선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복어조리기능사와 같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다루어야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생선이기 때문이다.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그 맛에 홀려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노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미식가로 꼽히는 소동파의 시에 이런 구절이 보인다. 그는 “물 쑥은 땅에 가득하고 갈대 싹은 짤막한데, 이때야말로 하돈이 올라오려는 때로구나.”(蔞蒿滿地蘆芽短, 正是河豚欲上時)라고 읊은 바 있다. 물 쑥은 약초로도 널리 쓰이는데, 봄이 되어 올라오는 싹은 국이나 나물무침으로 먹으면 향기롭다. 옅은 녹색으로 땅을 헤치면서 올라오는 갈대 싹은 식용으로 널리 사용되지는 않지만, 봄날의 강가 벌판을 아름다운 빛으로 채색한다. 물 쑥과 갈대 싹이 세상에 얼굴을 내밀면 봄이 시작되고 강에서는 드디어 복어가 잡히기 시작한다.

복어가 잡히는 때는 대체로 고사리가 한참 물이 올라서 맛이 좋을 때와 같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시에는 복어의 살이 오르는 것과 고사리가 살찌는 것을 함께 언급하는 경우가 제법 많다. 조선 전기 유학자인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시에 보면 한식 무렵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하돈이 강물로 올라오고 고사리 싹이 새롭겠구나”(河豚上水蕨芽新)라고 읊은 바 있다. 봄이면 복어를 즐기는 풍류를 많은 선비가 노래하곤 했다. 조선 후기 문인 서영보(徐榮輔, 1759~1816)는 초여름이 되어서 복어를 구할 수 없는 서운한 마음이 든다면서, 미나리 잎과 참깨의 맛이 유독 좋은 시절에 복어의 계절을 떠나보내는 것이 안타깝다는 시를 지은 적도 있다. 이처럼 봄이 되면 복어는 많은 사람에게 식도락을 전해주는 식재료로 각광을 받았다.
복어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잡히는 물고기라서 허균 역시 자주 맛보았을 것이다. 그는 ‘도문대작’에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하돈(河豚). 한강에서 나는 것이 맛이 좋은데 독이 있어 사람이 많이 죽는다. 영동(嶺東) 지방에서 나는 것은 맛이 조금 떨어지지만, 독은 없다.”
허균이 복어에 대해 주목한 것은 두 가지다. 독이 있으므로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 한강에서 잡히는 것과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 잡히는 것이 있는데 그 나름의 특징이 있다는 점이다. 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기록하였는데, 실제로 모든 복어가 독을 가진 것은 아니다. 독성이 강한 종은 한 마리에서 채취하는 독으로 성인 30명 이상을 독살할 수 있을 정도지만, 가시복이나 개복치처럼 독성을 함유하지 않은 종도 있다. 따라서 허균이 서술한 한강의 복어와 영동 지역의 복어는 종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사람의 취향은 미묘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 때의 긴장감이 주는 즐거움을 좋아한다. 복어의 독을 즐기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독을 넣어서 만든 요리를 먹고 죽음 직전까지 가보는 경험을 즐기는 것은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취향이다. 그러나 ‘도문대작’에 서술된 사람들, 즉 복어 독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음식의 맛을 즐기다가 변을 당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조선 시대 기록에는 복어를 먹고 죽은 사람에 대한 기록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이민구(李敏求, 1589~1670), 이덕무(李德懋, 1741~1793) 등의 작품에서 배가 고파서 복어를 먹다가 죽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특히 이덕무는 자신의 글에서 복어 먹는 것을 여러 차례 경계하였다. 심지어 부친의 일화를 예로 들어가면서까지 복어 독을 조심하도록 했다. 그의 부친은 평소 술을 즐겨 마셨지만, 관직 생활을 시작하면서 술을 끊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흡연과 복어 먹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먹고 살기 위해 어찌 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겠느냐”면서 늘 경계했다고 한다.
물론 복어 독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세종 6년 12월 왕조실록에 기록된 기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전라도 정읍현의 전별장(前別將) 정을손(丁乙孫)이 그의 딸 대장(臺莊)과 후처(後妻) 조이(召史)가 음란한 행실이 있다면서 이들을 구타하고, 또 대장의 남편 정도(鄭道)를 구타하여 내쫓으려고 했다. 그러자 정도가 복어의 독을 정을손이 먹는 국에 타서 독살하였는데, 조이와 대장은 그의 범죄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결국, 정도는 옥중에서 사망했으며 조이와 대장은 법률에 의거하여 사형에 처했다고 한다.
범죄 때문이든 생활 때문이든 복어 독 때문에 인명 피해가 많이 생기자 사회적으로 해독하는 방법이 공유되었다. 허준(許浚, 1539~1615)의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복어 독에 중독이 되면 빨리 갈대 뿌리를 찧어서 즙을 마시게 하거나 인분(人糞)의 즙이나 향유를 많이 먹여서 토하게 하면 낫는다고 했다. 또는 백반가루나 백편두 가루를 물에 타서 먹이거나, 양제엽(羊蹄葉) 가루를 찧어서 즙을 내서 먹이도록 했다.
똑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는 말도 있다. 독을 가진 복어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이렇게 강력한 독을 가진 복어지만 사람만이 거의 유일한 천적이라고 한다. 남의 생명을 해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는 하지만, 복어의 독까지 미식의 재료로 삼는 것에서 나는 문득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끝 모를 식욕 혹은 식탐을 보기도 한다. 끼니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나를 돌아보면서 쓴웃음을 짓곤 하는 것이다. 어느새 내 식탐도 무한한 우주만큼이나 커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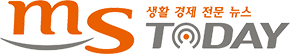

자꾸 약쟁이들이 생각 나는 건 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