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문대작(屠門大嚼)’은 푸줏간 앞을 지나면서 입맛을 쩍쩍 크게 다신다는 뜻이다. 이 책은 허균의 방대한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저술된 일종의 음식 관련 저술이다. 다시 분류하자면 음식문화를 기록한 책으로 보아야 한다. 허균의 고단한 유배지 식탁은 과거 풍성한 식탁 귀퉁이조차도 구경할 수 없는 처지였다, 이를 극복한 것이 바로 상상력이었다. 그런 궁핍한 현실 속에서 허균의 미각적 상상력이 한 권의 책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김풍기 교수와 함께 걸작 도문대작을 탐닉한다. <편집자 주>
조선을 대표하는 문장가인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 1564~1635)는 1603년 8월 금강산을 유람하고 난 뒤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월사집 권38)를 남긴다. 그는 한양에서 출발하여 8월 11일 함흥에 도착해서 일을 본다. 무사히 공무를 마치자 한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데, 함경도 관찰사가 며칠 쉬면서 함께 주변을 둘러보자고 한다. 16일 저녁, 함경도 관아에서 관리하는 누정인 낙민루(樂民樓)에 올라 달구경을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뱃사람들이 물고기 잡는 것을 보게 된다. 어민들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넓게 쳐놓았던 그물을 잡아당기니 물고기가 제법 잡혔다. 그물을 헤치면서 살펴보니 연어(鰱魚) 또는 방어(魴魚)가 주로 잡혔는데, 큰 놈은 한 자가 넘고 작은놈은 부채만 했다고 표현했다. 그 물고기 몇 마리를 회로 쳐서 술을 곁들이니 그 풍미가 좋았다고 한다.
조선 시대 함흥 지도를 살펴보면 함흥 감영 구역 옆으로 성천강(城川江)이 흘러간다. 북문과 서문 가운데쯤에 출입구가 하나 있고, 그곳의 문루가 바로 낙민루다. 낙민루를 나서면 만세교(萬歲橋)라는 제법 큰 다리가 있고, 다리 아래로 성천강물이 흘러서 동해로 간다. 이정구가 술을 마시면서 구경했던 고기잡이는 만세교 아래에서 벌어졌던 풍경일 것이다. 그가 말하는 연어와 방어는 모두 회귀성 혹은 회유성 어종이기 때문에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성천강에서는 이들 어종이 돌아오는 철에 늘 잡히는 물고기였다. 이 글이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방어 때문이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방어는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기록에 등장한다. ‘시경(詩經)’ 주남(周南) 여분(汝墳) 장에 “방어의 붉은 꼬리, 왕실이 불타는 듯”(魴魚赬尾, 王室如燬)하다는 표현이 있다. 주희(朱熹)가 붙인 해설에 의하면 “방어가 피로하면 꼬리가 붉어진다”고 하였다. 군자(君子)가 난세에 벼슬을 하면 왕실의 잔혹함을 두려워하여 안색이 늘 초췌한 것이 마치 방어 꼬리가 붉어진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시대가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다고 판단되어 군자의 고심이 깊어지면 늘 이 구절을 활용하여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곤 했다. 조선 시대 시문에서 방어는 ‘시경’ 구절 때문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실생활에서 방어를 보지 못한 선비들도 어쩌다 방어를 보면 ‘시경’의 해당 구절을 떠올렸을 것이다.

고대 중국의 기록에 이미 등장하는 것을 보면 방어는 한반도 지역에서도 일찍부터 즐겨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시대 지리지를 보면 어느 책이나 동해안과 남해안 일부 지역의 토산물로 기재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강원도와 함경도 지역에서 주로 잡히는 물고기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므로 이정구가 함경도 함흥에 가서 방어를 잡는 어부를 목격한 것은 당연히 그럴 만하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 회유성 어종인 방어는 대체로 늦봄부터 여름까지 북상해서 함경도 해역까지 올라간다. 늦여름부터 이듬해 봄까지는 남하하여 회유한다. 연어와 다른 점은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 민물로 올라오지만, 방어는 바다 표면에 알을 낳고, 그렇게 부화한 치어는 연근해 유역에 서식하는 수초 주변에서 살아간다. 여름 내내 몸집을 키운 방어는 다시 남하하는 것이다.
허균은 ‘도문대작’에서 방어를 이렇게 서술하였다. “방어(魴魚). 동해에서 많이 나지만 독이 있어 임금께는 올리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해에서 주로 생산되니 허균의 서술은 그 점을 명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방어에 독이 있다는 대목이다. 나 역시 겨울이 되어 방어 철이 되면 한 번쯤은 방어회를 마주하곤 한다. 꽤 오래 방어회를 즐겼지만, 독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허균의 서술이 조금은 뜬금없었다. 자료를 뒤져보아도 과문(견문이 적은)한 탓인지 방어에 독이 있다는 기록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방어를 먹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생선은 매우 기름지다. 여름 방어에는 기생충이 있어서 회를 뜨기가 조심스럽지만 겨울 방어는 상대적으로 여기서도 자유로우면서도 기름기가 풍부하다. 떠놓은 회의 붉은 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우의 마블링에 비견될 정도로 탱탱한 살과 기름기의 조화가 대단하다. 방어는 1m 이상 자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한 마리를 해체하면서 먹는 재미가 있지만, 근대 이전에는 이런 음식 문화가 없었다. 게다가 방어를 회로 먹는 것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쉬운 일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방어를 회로 먹었을 것인데, 기름기가 워낙 많으므로 많이 먹으면 배탈이나 설사 증세가 나타난다.
방어에 독이 있다는 허균의 서술은 아마도 이 같은 점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추정해 본다. 또 많은 생선이 임금의 상에 올랐지만, 방어는 왕조실록과 같은 기록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방어의 독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허균의 말처럼 방어를 임금의 상에 거의 올리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 아닐까.
덩치가 크면 클수록 선호도가 높아지는 생선이 거의 없지만 방어는 큰 것이 비싸게 거래된다. 크기도 하지만 힘도 좋아서 그물이 시원치 않았던 조선 시대에는 그물을 망치기 일쑤였다. 대방어는 잡기도 만만치 않지만 한꺼번에 많은 양의 생선 살을 얻기 때문에 처치가 곤란하다. 다행히 겨울이 제철이기 때문에 갑자기 상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염장을 하기도 했다. 여러 환경 때문에 방어는 값이 비쌌다. 조선 말기 지규식(池圭植)의 ‘하재일기(荷齋日記)’ 1892년 11월 19일 자 기록에 보면 방어값으로 10냥을 지급한 내용이 들어있다. 얼마나 많은 양을 사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날 돼짓값이 30냥이라고 했으니 방어 값이 꽤 비쌌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겨울이 깊어지면 방어를 먹자는 벗들이 더러 있다. 큰 방어를 구했으니 핑곗김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자는 심산이다. 방어계(魴魚契)라도 만들어서 흥성다움을 즐기고 싶어지는 요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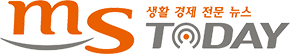

회 한접시 먹고싶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