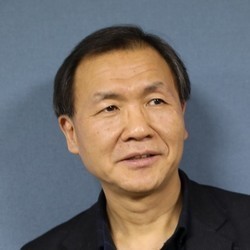
88서울올림픽 이전만 해도 프랑스 칸에서는 한국이 영화를 만드는 나라인지도 잘 몰랐다. 그 정도로 한국은 해외에서 영화 변방국이었다. 당시 칸에서 동양 최고의 영화제작국가는 일본이었다.
이미 일본은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1950년 만든 ‘라쇼몬’이 베니스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54년에는 ‘7인의 사무라이’로 베니스영화제 은사자상을 수상했다. 이어 80년에는 ‘카게무샤’로 칸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구로사와는 뛰어난 영상미학과 휴머니즘 추구 외에도 전통과 현대를 잘 접목시킨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은 ‘나라야마 부시코’로 83년에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데 이어 ‘우나기’(1997)로 또 한 번 받아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두 번이나 받았다. 오즈 야스지로, 미조구치 겐지, 나루세 미키오와 같은 뛰어난 감독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일본은 칸에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2018년 ‘어느 가족’으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것을 제외하면 한국이 단연 우세다.
한국은 세계 최고 권위의 칸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2관왕에 올랐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칸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제75회 칸영화제 시상식에서 송강호는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의 한국영화 ‘브로커’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박찬욱은 ‘헤어질 결심’으로 임권택 감독의 ‘취화선’(2002)에 이어 한국 감독으로는 두 번째로 감독상을 받았다.
박찬욱 감독은 ‘올드보이’(2004)로 처음 칸에 초청된 18년 전에는 한국이 영화산업에서 변방 국가라고 했다. 이제 한국영화는 ‘기생충’의 황금종려상, ‘올드보이’의 심사위원대상, ‘시’의 각본상, 전도연의 여우주연상을 포함해 남우주연상과 감독상(임권택+박찬욱)까지 더하면 칸의 모든 주요한 상을 다 받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국영화를 유럽에서 주목하게 만들었을까? 우선 영화인들의 꾸준한 노력을 들 수 있다. 봉준호, 윤여정 등 연출과 연기뿐만 아니라, 촬영 미술 등 제작 전반에 걸쳐 내용과 스타일은 물론 산업적인 발전까지 거듭해왔다. 역시 단시일에 집중력을 발휘해 인간 내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한국영화인의 DNA가 있는 것 같다.
1996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27회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도 한국영화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아시아에서는 1985년 창설된 도쿄국제영화제(TIFF)가 부산영화제보다 더 오래됐지만, 지금은 부산영화제가 훨씬 더 유명하다. 부산영화제를 경쟁영화제인 도쿄영화제와 달리 비경쟁영화제로 만들어 차별화를 꾀했고, 결과적으로 좋은 영화가 부산영화제에 대거 몰릴 수 있었다. 부산영화제는 질 높은 외국영화를 볼 수 있는 등 한국영화의 눈을 크게 높여준 베이스였다.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에는 탕웨이가 여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송강호가 남우주연상을 받은 한국영화 ‘브로커’는 고레에다 감독이 각본을 쓰고 연출했다. 아시아 각국의 뛰어난 배우와 감독이 한국영화와 교류한다는 것은 한국영화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단적인 증거다.
박찬욱 감독은 “한국영화는 장르영화 안에서도 웃음, 공포, 감동이 다 있기를 바란다”면서 “그 정도로 한국 관객들의 요구사항이 까다롭다. 제작진이 많이 시달리다 보니 한국영화가 발전했다”고 했다. 송강호도 “한국영화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이런 게 문화콘텐츠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한국영화는 제작진뿐만 아니라 관객들의 역동성으로 인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