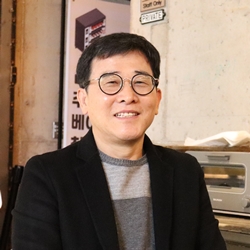
지난해에는 5월이 되어서야 개학을 하는 사상 초유의 심각한 상황이 교육현장에 펼쳐져 학생, 학부모를 비롯해 교사 및 교육현장의 모든 관계자들이 발을 동동 굴렀던 슬픈 기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올해는 모든 학교가 개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고, 출근길에는 밝은 얼굴로 학교를 향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들입니다.
길을 지나다 문득 눈에 들어오는 화원을 노랗게 물들여 놓은 후리지아 꽃 주위로 하얀 순백의 꽃을 피운 작은 카네이션과 하얗고, 노랗고, 분홍 혹은 주황에 강렬한 빨강으로 꽃잎을 터치한 듯한 신비디움이 옹기종기 모여 화사한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교정을 빙 둘러싸고 있는 나무 가지에서도 연초록 잎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봄의 싱그러움을 잔뜩 담고서 교실로 들어섭니다. 스물 다섯명의 제자들과 담임, 이렇게 스물 여섯명이 탄 열차는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깐 털커덩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간이역에 잠시 정차했나 봅니다. 그 간이역, 금형과 3학년 1반 교실의 흑판 위 오른쪽 벽에는 조그마한 액자에 이런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 젊음... 이것들은 늘 진행형이어야 합니다.’라고요. 바로 금형과 3학년 1반 급훈입니다. 머지않아 사회생활을 앞둔 스물 다섯명의 제자들에게 급훈에 담긴 담임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줄까 합니다. 그 이야기는 26년 전으로 돌아가서 시작됩니다.
회사를 다니다 뒤늦게 교직에 발을 들여놓은 내게 있어서 담임이라는 임무는 상당한 설렘과 함께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어떤 모습을 부각시켜 주어야 하는가?’라는 부담감이 적잖게 다가왔습니다. 동료교사에게 자문을 구해보기도 하고 또 나의 학창시절을 기억해 내며, 그때 어떤 행동을 하신 담임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남는가를 헤아려 보며 몇 날을 엎치락뒤치락 거렸는가 봅니다. 책을 뒤적여보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간추려도 보고,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가요를 파악해 보고, 또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유머를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으로서 어떻게 학급을 이끌어가겠다는 몇 가지 목표를 설정하느라 많은 시간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몇 가지는 복장을 단정하게 할 것, 공부는 열심히 하되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취미를 가질 것, 학급 내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사후에라도 꼭 담임선생님께 보고를 할 것, 그리고 웃어른이나 선생님 또는 학교를 방문하는 손님에게는 예절을 갖춰 인사를 잘하자 등이었습니다.
복장을 단정하게 하자는 것은 비싼 옷이나 비싼 신발을 사서 신는 것보다는 규정된 복장을 깨끗하게 착용해서 학교의 이미지를 좋게 함으로써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자는 취지에서였고,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졸업 후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야 하게 됨으로 여가 시간을 얻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취미를 가져야 대화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또 가정에서도 악기를 이용해서 음악과 접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든지 담임선생님께 보고를 철저히 하자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이니 만큼 대학진학보다는 취업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이 많은지라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좀더 체계적인 질서를 몸에 배이게 하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첫날 교단에 서서 새 학기를 맞이한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바라보면서 나는 학생들에게 내 자신이 스스로 다음 것들을 지키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학생들이 인사를 하면 나 또한 예의를 갖춰 인사를 받아줄 것과 그들의 학교생활에 구석구석 내 자신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생각을 파악하고 그들의 노력에 동참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극부와 학교신문 발간에 관심을 갖고 학교신문 기자들과 자주 토의를 하면서 의견을 교환했고 학생들의 세계에 조금씩 조금씩 발을 내밀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인사를 성의껏 받아주니 이제는 퇴근 후에 길에서 마주쳐도 환한 웃음으로 인사를 해오는 제자들이 있기에 교사라는 직업에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됐습니다.
잠시 정차했던 간이역에서 다시금 다음 역을 향해 출발해야 하겠지요. 남은 여정에 있어서는 잠시 누군가의 글을 빌려 제자들에게 전하려 합니다. '내 안에 빛나는 1%를 믿어준 사람'을 쓴 ‘제인 블루스틴’의 글이지요.
나는 교사다.
교사는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여기엔 마법이 있을 수 없다.
나는 물 위를 가를 수도 없다.
다만 아이들을 사랑할 뿐이다.

